커피를 처음 만난 것은 6살쯤으로 기억된다. 1972년도쯤이겠다. 선친이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던 터라 집에는 손님이 잦았다. 어머니는 접대용 음료로 홍차와 커피를 주로 내놓으셨다. 어머니는 이들 음료를 식혜와 수정과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 같다.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는 장면은 마술과 같았다. 어머니는 병에서 2스푼 정도 진한 커피가루를 꺼내 잔에 담고 그 위에 각설탕을 2개 올리셨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잔의 4분의 3가량이 차도록 붓고 휘휘 저으며 커피와 설탕을 녹였다.
마술은 지금부터다. 커피 자리에는 항상 간장종지만한 작은 그릇에 모락모락 데운 우유가 담겨 있었다. 하얀 우유가 검은색 커피용액에 섞여 들어가는 모습은 악마가 하얀색 스카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즈음 커피의 향기는 그윽하게 바뀌었다.
병에 담긴 커피가루의 냄새는 어린 나에게는 유쾌하지 않았다. 흙이 묻은 칡뿌리와 할아버지 곰방대, 그리고 뒷집 철봉이네가 키우던 소의 마른 여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듯했다. 이런 커피가 우유를 만나는 순간, 부드러워지는 모양도 모양이거니와 향기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악마가 천사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우유는 종종 홍차가 담긴 잔에도 부어졌지만, 그 잔에는 악마가 없었기 때문인지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다. 해질녘 뒤뜰에 내걸린 여동생의 기저귀에 비치는 노을처럼 경계가 밋밋하다는 인상이 떠올라 혼자 피식 웃고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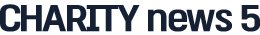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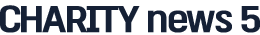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